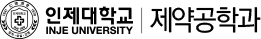자료실
신약 개발 실패율 99.6%…‘치매’ 치료 어디까지 왔나
- 조회수 827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작성일 2019.11.14
대표적인 난치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isease)의 신약이 좀처럼 개발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미충족 수요를 반영한 치료제들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30일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알츠하이머 얼라이언스 포럼 2019’에서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양동원 교수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 및 신약 개발 상황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신약 개발 실패율은 99.6%에 달할 정도로 연구 진척이 더딘 분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가장 접근성이 높은 치매 증상 조절제로는 콜린 분해효소 억제제(Cholinesterase inhibitors, ChEls) 계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리셉트(성분명: 도네페젤)와 엑셀론(성분명: 리바스티그민), 레미닐(성분명: 갈란타민)이 1996년부터 2001년에 걸쳐 각각 승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퇴행된 뇌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치료제는 아니다. 양 교수는 “콜린 분해요소 억제제는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빨리 사용할수록 어느 정도 진행을 더디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효과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 중 1/3은 치료를 해도 호전 없이 증세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2003년 NMDA-수용체 길항제(NMDA-receptor antagonis) 계열인 에빅사(성분명: 메만틴)가 등장했다. 메만틴은 1982년 기질적 뇌기능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했다가, 1990년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돌입해 약 13년 만에 FDA의 승인을 얻어낸 약물이다.
메만틴의 등장으로 인해 치매 치료는 새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유일한 치료 옵션이었던 콜린 분해요소 억제제와 함께 시너지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양 교수는 “콜린 분해효소 억제제와 메만틴을 병용하는 것은 콜린 분해효소 억제제를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치매 환자의 요양시설 입소까지의 기간을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등장했다. 지난 3월 임상 연구가 중단된 치매 신약 후보 물질 ‘아두카누맙’이 FDA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된 것.
이두카누맙은 바이오젠이 개발해 온 신약으로, 임상 3상에서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해 임상이 중단됐지만 고용량(10mg)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호전시키는 경향을 보여 품목 허가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 교수는 “만약 이두카누맙이 FDA의 허가를 받게 되면 최초로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치료제가 된다. 물론 약가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매 신약 개발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다.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과도하게 축적된 아밀로이드가 공통적으로 발견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연구는 아밀로이드 단백 생성을 억제하거나 아밀로이드 단백을 제거하는 방향, 아밀로이드 백신 등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타우단백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과 신경세포성장인자 등에 관여하는 방법, 줄기세포이식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양 교수는 “치매는 병이 아닌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한 증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퇴행성 질환, 뇌혈관 질환, 감염성 및 대사성 질환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 사회 활동, 올바른 식습관, 체중 조절, 금연, 금주 등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단, 40대 중반부터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36750